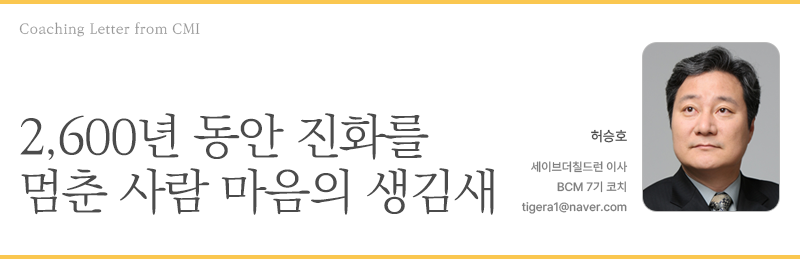 | ||
서울 인왕산 자락, 독립문 근처에 ‘딜쿠샤’라는 이름의 건물이 있다. 1923년 미국인 앨버트 테일러가 지은 2층 붉은 벽돌집이다. 일제 강점 당시 서울에서 AP 통신사 기자로 일하던 테일러는 3·1운동의 발발을 타전해 한일(韓日) 병합이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조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진 일임과 조선의 깨어있음을 외부 세상에 처음 알렸다. 이 일로 6개월간 경성감옥(현 독립문공원)에 갇혔고, 훗날 태평양 전쟁으로 미국과 일본이 교전국이 되자 적국민(敵國民)으로 조선에서 추방되기에 이르렀다. 복원을 거쳐 2001년 서울시 민속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딜쿠샤는 이처럼 역사성이 풍부할 뿐 아니라 아름답기도 하다. ‘마음의 평화’를 이상향으로 본 인도인들 딜쿠샤는 힌두어로 ‘이상향’이라는 뜻이며 원래의 의미는 ‘마음의 평화’라고 한다. 이상향을 가리키는 단어는 언어권마다 다르다. 고대 중국인들은 복사꽃 핀 곳 무릉도원(武陵桃源)이라 했으나 현대 중국어로는 안락향(安樂鄕) 즉 편안하고 즐거운 곳으로 바뀌었다. 중국인들의 의식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까? 일본어로는 세속에서 벗어난 은밀한 마을 가쿠루자토(隠る里)이다. 고대 영어로는 아서왕의 궁전 카멜롯, 혹은 켈트어에서 기원한 사과의 섬 아발론이며 라틴어로는 현세에 없는 곳 유토피아(Utopia)라 한다. 스페인 사람들은 황금향이라는 뜻의 엘도라도라고 해 그들의 현세 지향성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언어는 사고의 집이자 세계관의 표현이라 한다. 이상향을 가리키는 단어로 마음의 평화를 택한 인도인들이 놀랍고, 자기 집을 그리 이름한 기자 테일러가 궁금하다. 문득 딜쿠샤 얘기를 꺼낸 것은 요즘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인지심리학의 한 갈래인 수용전념치료(ACT, Acceptance & commitment Therapy) 이론을 접하면서 '마음의 평화'라는 주제에 몰두해 있기 때문이다. 아마 최근 몇 개월 간 내 마음의 평화가 깊숙이 위협 받는 상황이 한둘 펼쳐져 고통이 심했던 탓인 듯하다. 그러다 ACT를 공부하면서 현실을 기꺼이 수용하기, 심리적 유연성, 지금-여기에 머무르기, 자신을 메타-인지하기 등 ACT의 개념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온 것이다. 그리고 군 전역 이후 40여 년간 하지 않던 명상도 다시 시작했다. 20대 초중반, 병사로 복무하던 시절 난 일요일이면 영내 법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불편한 고참들이 포진한 내무반을 떠나 있고 싶다는, 피신(避身)의 목적이 컸다. 법당에 머무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교 관련 책을 접했고 예불하면서 명상도 하게 됐다. 붓다가 가르침을 베낀 듯한 심리학 이론 지금 코칭을 배우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코칭이나 심리학에서 등장하는 많은 개념이 그때 읽은 선불교의 내려놓음, 지관(止觀), 명상 등과 상통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놀라워하고 있다. 2,600년 전 고타마 싯다르타라는 사나이가 인생을 고해(苦海)라 하고 그 고통의 바다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깨달음과 자기 발견, 내려놓음, 그리고 지금-여기에 머무르기를 제시하면서 이를 득도(得道)라 불렀는데, 1990년대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의 영성주의자들은 물론 현대 심리학자들까지 베낀 듯이 닮은 얘기를 하고 있다니…. 참으로 신기하고 경이로운 일이다. 내가 잠정적으로 내린 추론은 이렇다. “아마 이 같은 일치는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 마음의 구조, 마음 생긴 모습이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일 거야. 마음의 얼개와 모양이 똑같으니 고통을 느끼는 기제(메커니즘)도 동일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로도 다들 비슷한 방향을 찾은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다. “더 좋은 코치가 되고 좀 더 완성도 높은 코칭을 하고 싶어 심리학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셀프 코칭, 셀프 테라피를 하게 됐어. 그러면서 내 마음의 고통이 조금씩 완화되고, 더 좋은 삶을 살며, 나아가 더 좋은 사람으로 변성되는 듯한 경험을 하고 있네. 고마워 코칭, 고마워 ACT! * 칼럼에 대한 회신은 tigera1@naver.com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
-
PREV [이정수] 혁신에는 나이가 없다
-
NEXT [고현숙] 대통령의 리더십, 무엇이 필요한가?
